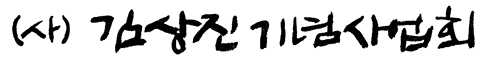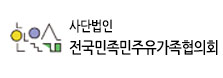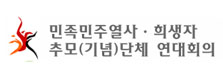박선아 (퍼실리테이터 클럽 대표, 농경제 08)
오늘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고 학생회활동을 주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 ‘시민참여’ 활동이라고 불릴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퍼실리테이터 클럽은 큰 토론회도 열지만 중간지원조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토론 기술로 알려진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원래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숙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컨설팅 의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연관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대문구 청년참여 조례 연구용역과 성북구 시민참여 플랫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군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보람 있지만, ‘관’과 사업을 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챙겨야 될 문서는 많고 그들의 언어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렇겠지, 혈세니까 깐깐하게 하는 거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시민활동가와 공무원이 한 테이블에 앉았던 토론워크샵에 참여하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태 100여개가 넘는 토론회나 워크샵을 진행하거나 참여했지만, 가장 서늘한 분위기의 토론워크샵이었습니다.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시민활동가와 관 사이에 갈등의 골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느꼈던 ‘시민참여’에서의 불편함이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버넌스나 시민참여를 보는 눈도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거버넌스라도 해주니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서울로 7017’ 사례와 이를 둘러싼 평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7017은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시민길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지난달 개장했습니다.
광고는 정말 많이 봤지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광고에서 어떤 가치지향도 느낄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미세먼지, 땡볕, 소음으로 둘러싸인 서울로 7017은 녹지도 부족하고 그늘도 없습니다. 서울로 7017은 하이라인(High Line)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따왔지 하이라인의 ‘정신’을 벤치마킹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이라인은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 온 뉴욕 시내를 연결하는 ‘철도’길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이를 철거하려했을 때 뉴욕 주민 2명이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하이라인을 보존한 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죠.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설득, 토론 끝에 하이라인은 역사와 사람, 감동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깜짝 이벤트처럼 등장한 서울로 7017은 ‘시민길’이라고 부르기에는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관이 생각하는 ‘시민’이 무엇인지 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정권이 바뀐 탓인지 시민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이번 정부엔 유독 시민활동가 출신의 인사들이 영입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시민의, 혹은 민중의 권한이 높아지는 방식일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북구 시민참여 워크샵에서 보았던 관 중심의 ‘거버넌스’, 서울로 7017 사례처럼 형식적인 ‘시민 중심’이 공공연한 주류가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그저 진보적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비꼬듯이 사용되고 있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느낌도 ‘관이 허락한 거버넌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iran Head와 John Alford에 따르면 오늘날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요청되는 것이라 봅니다. 환경문제도 일자리문제도 심지어 통일문제도 관이 주도하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역할과 요구가 거버넌스라는 미명하에 소리 없이 흡수되는 방식이 아닌, 더 많은 요구가 분출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관과는 협상하고 설득하되 시민 주체들이 스스로의 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 역할이 아닐까요.
.
박선아 _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 08학번.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퍼실리테이터 클럽 대표를 하면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468nice@gmail.com)
Last modified: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