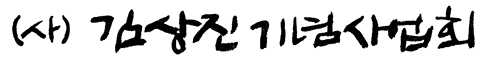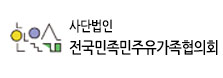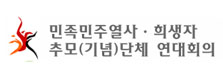[가신이의 발자취] “춤추며 싸운” 일농 김준기 선생을 기리며
(2023년 8월 27일자 한겨레신문)
한도숙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1987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이른바 운동권에서 불린 노래 가운데 하나인 농민가의 도입부다. 나의 농민운동도 이 노래부터 시작한다. 89년 여의도 투쟁으로 감옥살이한 정수일 씨 등의 재판에 응원 갔던 농민들이 방청석에서 함께 불렀던 감격스러운 노래다. 때로는 손가락 깨물어 혈서를 쓰면서 불렀고 때로는 트랙터를 끌고 상경하면서 의지를 불태웠던 노래다. 투쟁의 처음이자 끝을 장식하는 이 노래에 일농 김준기 선생의 손때가 묻어있다.
김준기 선생은 이 노래를 깎고 다듬어 농민들이 쉽게 부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선생은 “아니 내가 만든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불려 오던 노랜데 곡조와 가사를 손질하고 손질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굳어지게 된 거지”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김준기 선생과 나는 오래된 인연이 있다. 1958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선생은 서울시농촌지도소에 근무했다. 선생은 그때 이미 사람 농사를 지으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4-H운동이 농촌에 파고들 때 압구정 우리 동네에도 4-H구락부가 조직됐다. 동네 남녀 선배들을 조직하고 교육했던 분이 바로 김준기 선생이다. 나는 나이가 어려 당시 그곳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끌고 먼지 날리는 신작로를 달려 젊은 농민들을 만나곤 했던 김준기 선생을 기억한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 퍼즐을 서로 맞추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선생의 사람 농사는 평생을 걸쳐 이어지는 끈질김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여성농민운동의 대모라 일컬어지는 김영자 선생과 결혼 뒤 상계동 빈민촌에서 지은 비닐하우스 농사도 사람 농사에 다름 아니다. 신구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후학들을 지도했고, 각 지역의 농민교육에도 적절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당신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4-H가 관변화되자 ‘춤추며 싸우는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톨릭농민회 결성에 뛰어든다. 가톨릭농민회 경기지회를 만들고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선생의 논리는 분명했다. 조직되지 않은 농민은 정책의 부당함에 맞설 수 없다. 따라서 농민 다수를 조직화하고 그 조직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1989년 사람 농사의 연장 선상에서 ‘함께하는 농민’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그때 나는 그 광고를 보고 일 년 치 구독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농민은 5월 첫 호를 내고 폐간됐다. 첫 호 특집으로 ‘북한 농민 어떻게 사는가’라는 글을 실었다. 그로 인해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의 지론은 갈라진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의 자연환경이 퍽이나 달라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본 것이다. 편중된 농업문제를 풀어내려면 통일이 돼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북의 농업 상황을 잘 모르기에 이를 소개함으로써 노둣돌이 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경기 성남지역 시민운동에서 김준기 선생을 빼놓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광주대단지 투쟁에서 시작된 성남지역의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김준기 선생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다. 맨 앞에서 싸웠으며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후배들을 챙기는 살뜰함으로 그의 삶은 곤궁했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후배들이 도우려 하면 “됐다” 한마디로 자신을 다짐했다. 중앙의 통일 관련 단체들 주요 직함을 가지고도 누구 앞에 나서지 않는 기개 있는 학자풍의 인품이셨다.
선생이 태어난 경북 포항과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년 시절은 그의 완고한 성품을 만드는 중요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가족사 또한 그의 삶에 깊은 상처가 됐지만 선생은 이를 극복하고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분단의 극복이야말로 농업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사람농사야말로 이 일의 항구적 투쟁을 보장하는 사업임을 굳게 믿었다.
어떤 이들은 선생이 4-H연합회 회장을 여러 해 한 것을 두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생은 개의치 않고 4-H연합회를 이끌었다. 거기서 사람 농사의 결실을 보려 했다.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농업을 지키려 했다.
췌장암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길어야 6개월이란 말이 정설처럼 돼 있어 누구나 그 앞에선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도 의연하게 자신의 사람 농사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굳게 믿었다. 다만 “춤추며 싸우다 죽을 줄 알았다”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부담스러울 뿐이다.
Last modified: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