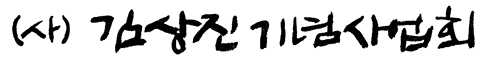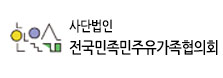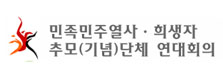이영수 (영천시농민회 사무국장, 농교육 94)
모 일간지에 소개돼 화제가 된 귀농 난민 김 씨의 사연은 이렇다. 서울에서 아로마 자영업을 하던 김 씨의 꿈은 시골에서 아로마 식물을 기르며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7년간 귀농학교를 다니며 귀농할 곳을 물색하다 전북의 한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지인 6명과 함께 귀농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귀농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귀농센터장이 소개한 땅과 주택건립비는 시세보다 10배 가량 비싸게 샀고 지인 2명은 중도에 귀농을 포기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귀농 2년 만에 2억 원의 빚을 진 김 씨는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시골에 계속 살 수도 없는 ‘귀농 난민’으로 전락했다. 김 씨의 사연을 읽으니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짠했다. 피우지 못한 귀농의 꿈이 안타깝고 또 한 명의 농민동지를 잃은 것 같아 서글프다.
11년 전 귀농하던 때가 불현듯 생각난다.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귀농인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회에서 실패해 오갈 데 없어 귀농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님 계시는 고향마을로 귀농했지만 동네어른들은 내게 ‘귀농(歸農)’ 대신 ‘낙향(落鄕)’했다는 표현을 하셨다. 심지어 영농후계자를 신청하니, 심사위원인 농민단체장 한 분이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은 농사 안 지을게 뻔하니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 설왕설래 끝에 겨우 영농후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향마을에 골프장이 생겨 대책위 총무를 맡아 활동을 했더니 ‘들어온 놈 하나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다’는 소문이 온 면에 쫙 퍼졌던 적도 있었다. 심지어 마을 합의금 4억 원을 못 받으면 나한테 책임을 지우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리고 그런 말을 흘린 사람이 앞에서는 큰 일 한다며 치켜세우던 내 친구의 부모고, 집안 형님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과수원에서 일하다 말고 누워 푸른 하늘을 보니 눈물이 흘렀다.
세월은 유수 같아 어느덧 귀농 12년차가 되었다. 이제는 농장에 견학도 제법 오고 가끔씩 귀농 성공사례로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 골프장 문제도 마을 합의금을 몇 배로 받고 전 주민의 박수로 웃으면서 마무리 지었다. 재작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았고, 올해 초에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임되었다.
우연한 자리에서라도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한 명의 농민동지가 생기는 것 같아 우선 반갑다. 동시에 과연 농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농사짓고 먹고살아야 하는 ‘귀농’에 대해서는 제발 심사숙고해서 냉철히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귀농을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농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무조건 살아남으라고, 같이 살아남자고 얘기한다. 흙·땀·자연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도 살아남지 못하면 다 허사이기 때문이다.
귀농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다. 몇 해 전 어떻게든 귀농인들과 친해지고 싶어 귀농모임에 기웃거렸더니 ‘귀농학교도 같이 안 나온 사람이 왜 왔냐. 순수한 귀농인들끼리만 건전하게 모임 했으면 좋겠다’며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닭백숙에 코를 쳐 박고 얼굴을 들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농민회원들이 주축이 돼 개설한 복숭아 공부방에 귀농인들끼리의 건전한 모임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대거 등록을 했다.

귀농인으로서의 혜택은 당연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는 꺼리는 폐쇄성은 ‘들어온 놈’이라는 괄시와 설움에 기인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몇 년 전이냐 수 십 년 전이냐 시간의 문제이지 지역민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들어온 사람이고 다 그런 ‘텃세’를 경험했던 선배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대범해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살아남은 귀농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우리 부부에게 농사짓고 살 만하냐고 물어보면,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없다고 답한다. 두려움에 지지 않고 귀농을 택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유야 어떻든 사연이 어떻든 귀농인들이여, 부디 농민으로서 지역민으로서 살아남아 주시라.
0
0
이영수_ 경북 영천시 임고면 효1리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1997년에 농대 부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학교 졸업 후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5년간 상근활동가로 일했습니다. 2008년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귀농하여 복숭아, 사과, 살구 등 과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Last modified: 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