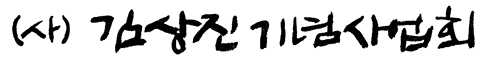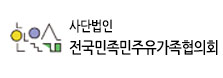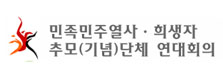박애란 (전 평택여고 교사, 후원회원)

서둔야학 스토리를 글로 옮긴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 이번 1월에 드디어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결같이 가슴에 품어왔던 저의 간절한 꿈이 이뤄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나?’ 스스로 생각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10대의 저는 서둔야학 선생님들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서둔야학 선생님들이 야학생들을 얼마나 살뜰히 아끼고 사랑했으면 제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것은 그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신 분들은 바로 서둔야학 선생님들입니다.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기록입니다. 서둔야학에서 공부한 기간은 4년이지만 그리움은 평생 가기에 ‘사랑 하나 그리움 둘’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교사로 근무하던 1992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최초의 계기인 ‘글만 쓰고 싶은 병’에 걸렸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글만 쓰고 싶은 병
우 선생님!
이게 몇 년 만인가?
실로 20여년 만에 접한 우 선생님의 소식은 나를 순식간에 격정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했다.
1992년 9월 4일이었다. 2교시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 와 보니 서둔야학 은사님인 이원정 선생님이 전화하셨다는 메모지가 보였다. 즉시 이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니 우명옥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다. 20여 년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우 선생님! 마침내 그분의 소식을 알게 된 순간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동료교사들의 시선을 미처 의식할 새도 없이 울고 있는 내게 그들이 물었다.
“누가 죽었어요?”
“아니요, 옛 은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린 누가 죽었나 했네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의 선생님들이기에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세요?”
영어담당 허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박애란 선생님 같은 제자 좀 가져봤으면.”
울음을 그친 나는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의 심정이었다.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 보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으며, 동료 교사들이 그저 좋아 보였고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나도 같은 교사지만 내게는 너무도 소중한 의미의 ‘선생님’인 동료교사들에게 자판기에서 사이다 50잔을 빼서 돌렸다.
“웬일이세요?”
“그냥요.”
거기에 얽혀있는 깊은 사연을 어찌 몇 마디 말에 담아낼 수 있으랴?
점심도시락을 못 먹었으며 학교에서는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기에 전화를 못 드렸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여서 실례를 무릅쓰고 밤 10시경에야 비로소 전화를 드릴 수 있었다.
“선생님 저 누군지 아셔요? 박애란, 서둔야학 박애란이에요.”
겨우 이 말만 하고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응 애란이,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결혼은 했니?”
“네.”
“아이는 몇이고?”
“남매예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지?”
“평택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서점을 하고 있고 저는 평택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애란이가 여학교 선생님이 됐구나.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겠구나.”
경북대학교 교수님인 사부님과의 사이에 삼남매를 두셨다는 우 선생님께 드릴 말은 산같이 쌓여 있었으나 후일을 기약하고 전화를 끊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달려가서 만나 뵙고 싶은 우 선생님이었다. 전화를 드린 후 12시에 잠이 들었던 내가 잠이 깬 것은 두 시간이 지난 2시였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글만 쓰고 싶은 병’에 걸린 것은.
작은 공간에 피아노며 아이들 이불장, 옷장 등이 꽉 들어차서 겨우 피아노 연습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의 방에 들어간 나는 방바닥에 무릎을 세운 자세로 앉아서 피아노 의자를 책상 삼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숙하나마 혼자서 간직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내게 넘치는 사랑을 쏟아주셨던 25년 전의 서둔야학 은사님들의 고귀하신 발자취를 꼭 글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다. 밤새워 작업을 했다. 온 밤을 미친 듯이 끼적여댔다. 밤새 내 눈물과 콧물로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가 거의 다 달아나 버렸다. 울다 쓰다, 쓰다 울다, 내 삶에 있어서 그 밤은 가장 격정적인 밤이었다.
평소에 나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밥부터 못 먹었다. 슬플 때는 물론이고 기쁘거나 화가 나도 심지어는 새 옷을 입는 날도 밥을 못 먹었다. 그러나 잠은 대체로 잘 잤는데, 이번에는 병세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잠까지 못 자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미가 없었으며 오로지 글을 쓰는 시간만 소중했고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처음에 남편은 어처구니 없어하며 내게 물었다.
“인아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도져서 그래요.”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아내를 호되게 질책했다.
“인아 엄마, 세상살이는 다 비슷한 거야. 누가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어렵겠어.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들 티 안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유독 인아 엄마만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야?”
“인아 아빠, 미풍에도 떨어지는 꽃잎은 있는 거예요.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네?”
그로부터 엿새 동안을 꼬박 밥은 하루에 한 끼, 잠은 두 시간을 자가며 울면서 글에만 매달렸다. 54kg의 몸무게가 1주일 만에 46kg가 되었다. 심하게 가슴앓이를 하여 피골이 상접한 아내를 본 남편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물었다.
“인아 엄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인아엄마 병이 낫겠어?”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글을 한도 끝도 없이 쓰고 싶어요.”
“인아 엄마, 인아 엄마의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와.”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에 매여 있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92년 12월 23일, 목이 긴 사슴이 되어 기다리던 나는 방학이 되자마자 기차를 타고 내 그리움의 끝에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신 대구로 겨울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겨울방학 내내 대구로, 서울로, 인천으로 기차와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기도 하며 내 그리운 얼굴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뵈었다. 대구에서는 우명옥 선생님과 이원정 선생님을, 서울에서는 조봉환 선생님과 박순직 선생님을 만나 뵈었고, 인천에서는 황건식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뵈었다.
조 선생님과 우 선생님은 만나 뵌 지가 20여년이 넘는 분들이었으나 나를 잊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바람 부는 추운 길목에서 내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 선생님을 뵌 순간, 입술을 깨물어도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20여 년이 지난 후 선생님들이 그리워서 병이 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선생님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연배의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혹독한 세월에 내게 끝없는 사랑을 주셨던 선생님들이기에 20여 년이 아니라 내 숨이 붙어있는 한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0
0
박애란 _ 선생은 서둔야학 시절 야학생과 교사로서 맺은 인연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본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평택에서 어릴 적 꿈이었던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였다
Last modified: 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