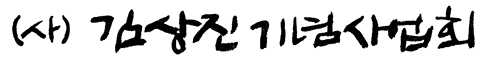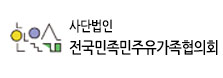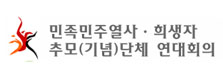신이 주신 자격증 ‘사랑’으로 가르친 참교육
임은경 (선구자 편집주간, 농학 95)
선구자에 ‘나 이렇게 산다’를 연재하시는 박애란 필자님이 올해 1월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북콘서트도 열었는데 사정상 가보지를 못했네요. 선생님은 어린 시절 서둔야학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농대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시고 있죠. 그 마음이 고마워서, 선구자에 꾸준히 글을 주시는 것이 또 고마워서 서평을 썼습니다. ‘서둔야학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선생님의 바람에 작은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1960년대에 야학을 다녔던 한 소녀가 야학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 평생에 걸쳐 눈물로 써내려간 사랑의 이야기이다. 요즘 학생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 당시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그들을 위해 밤에 수업을 했던 것이 야학이다. 야학은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되었고, 학비는 무료였다.
소녀가 다녔던 야학은 서울대 농대생들이 운영했던 수원의 서둔야학이었다. 어른이 된 소녀는 이를 악물고 노력하여 어린 시절의 꿈인 교사가 되었고, 30여 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두 손 모아 염원하던 간절한 꿈을 그녀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언젠가 서둔야학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꿈이었다.
“우리의 배움터가 새로 지어졌을 때, 전깃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책걸상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마다 나는 감격했다. 대학생으로서 낮에는 당신들의 공부를 하시고 밤에는 우리 공부를 가르쳐주신 후라 엄청 피곤하실 텐데도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위험하다며 꼭 집까지 데려다주시던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뼈에 사무쳤다. 나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언젠가는 이 얘기를 꼭 글로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거야. 반드시!’” p.85
소녀가 서둔야학에 다녔던 기간은 1964년에서 1967년이었다. 너나할 것 없이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소녀는 엄마에게 ‘중학교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엄마는 다음의 한 마디로 그녀의 청을 무지르고 만다.
“그러다 붙으면 어떡하려고.”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고달픈 처지에 중학교 입학이란 언감생심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 아름 절망만 껴안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타고난 감수성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좌절해야 했던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준 것이 야학 선생님들이었다. 가난과 생활에 지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쏟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진 야학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제자 사랑이었다. 사춘기 소녀들과 대학생 선생님들의 나이 차는 불과 두, 세 살. 하지만 제자들은 선생님들을 따르면서도 몹시 어려워했고, 언제나 이름 뒤에 ‘선생님’ 자를 붙여 깍듯이 모셨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대신 야학을 다닌 아이들
“야학생들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운 아이들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가난 때문에 정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온 아이들이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 내팽개쳐진 아이들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른들의 화풀이 대상은 아이들이어서 걸핏하면 욕설이나 매질로 집 밖으로 내몰리곤 했다.
하지만 야학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은 이미 집안에서 주눅 들어서 시들해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명랑함과 생기가 돋아 있었다. 눈빛 따뜻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것이다.” p.58
대다수 사람들이 다 가난했던 그 시절, 선생님들이라고 특별히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새우젓 장사를 해서 대학 학비를 댄 분도 있었고, 삯바느질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해 대학에 진학한 분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야학에서 필요한 칠판, 백묵, 시험지 등의 비품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했다. 나중에 학교 건물이 필요하게 되자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금하여 건축비까지 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총명하고 재능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자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 선생님은 “학비를 대줄테니 중학교 시험을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야학에 며칠째 나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연필과 공책을 사들고 집까지 찾아와서 ‘내일부터는 꼭 나오라’고 당부하고 가는 분도 있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는 메마른 소녀의 삶에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야학 선생님들과 글자 그대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저 멀리 아련히 등잔불이 흐르고 있을라치면 내 가슴에도 뽀오얀 봄 안개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선생님들이 미리 호롱불을 밝혀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다. 책가방이 없어서 넓은 소창 보자기에 책과 연필 몇 자루가 담긴 필통을 싸 가지고는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다녔던 나는 마구 뛰었다.
선생님들을 한시바삐 보고 싶은 나머지 길게 자란 풀섶을 헤치며 마구 뛰어갔다. 숨이 턱에 닿도록. 어제도 만났고 조금 후면 뵙게 될 테지만 그새를 못 참아서 마음이 그렇게 급했던 것이다. 그때 허리춤에서는 연필들이 아프다고 ‘달그락 달그락’ 소리치고 있었다.” p.42
지난해 수필가로 등단하고 시니어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글은 문장이 쉽고 간결해 소탈한 매력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진실의 힘’일 것이다. 가난에 눈물겨웠던 ‘어린 날의 뜨락’과 ‘영혼의 성지 서둔야학’을 거쳐, 신분 상승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한 젊은 시절 등의 이야기는 매 에피소드가 흥미진진하다. 책을 읽다보면 언제 책장이 다 넘어갔는지 모르게 금세 한 권을 다 읽게 된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교육이 있을까
내가 저자인 박애란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학교의 동문 모임에서였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을 ‘서둔야학 졸업생’이라고 당당히 소개했다. 50년 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간절한 꿈이 서둔야학 스토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녀처럼 두 눈을 반짝였다. 그 결과물이 마침내 올해 1월에 『사랑 하나 그리움 둘』(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야학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삶의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자기 자신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교육은 인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교육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어, 수학 공부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다.
“야학교 선생님들은 사람이 부여한 교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신이 주신 자격증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저자의 말은 진정한 교육이 사라진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 일침을 가한다. 자신들도 그리 넉넉한 입장이 아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쳐보겠다고 발 벗고 나선 스무 살 남짓의 청년들. 오직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사랑만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그런 선생님과 학교를 오늘날에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평생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요즘에도 과연 있을까?
책장마다 배어있는 저자의 가슴 절절한 진심은 읽는 이를 눈물짓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0여 년 전, 수원의 어느 변두리 동네에서 있었던 이 야학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준다. 이 야학생들이 받았던 교육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지금의 학생들이 받는 교육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최근에 접했던 그 어떤 로맨스 소설보다 훨씬 더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한편 읽었다.
.
.
임은경 _ 대학 졸업 후 인터넷 신문 ‘민중의소리’ 기자로 일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하고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이 글쓰기여서, 아무래도 이것이 평생의 업이 되지 싶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 간 들 의 이 야 기 에 깊 은 관 심 이 있 다 . 김상진기념사업회에서는 선 구 자 편 집 주 간 을 맡 고 있 다 . (atree12fly@daum.net)
Last modified: 2022-08-04